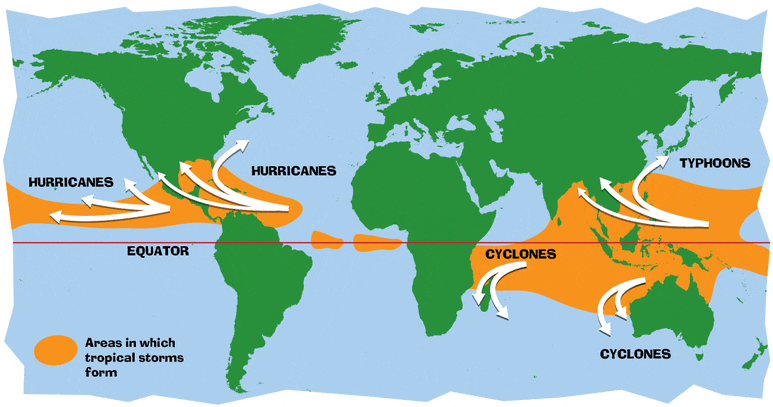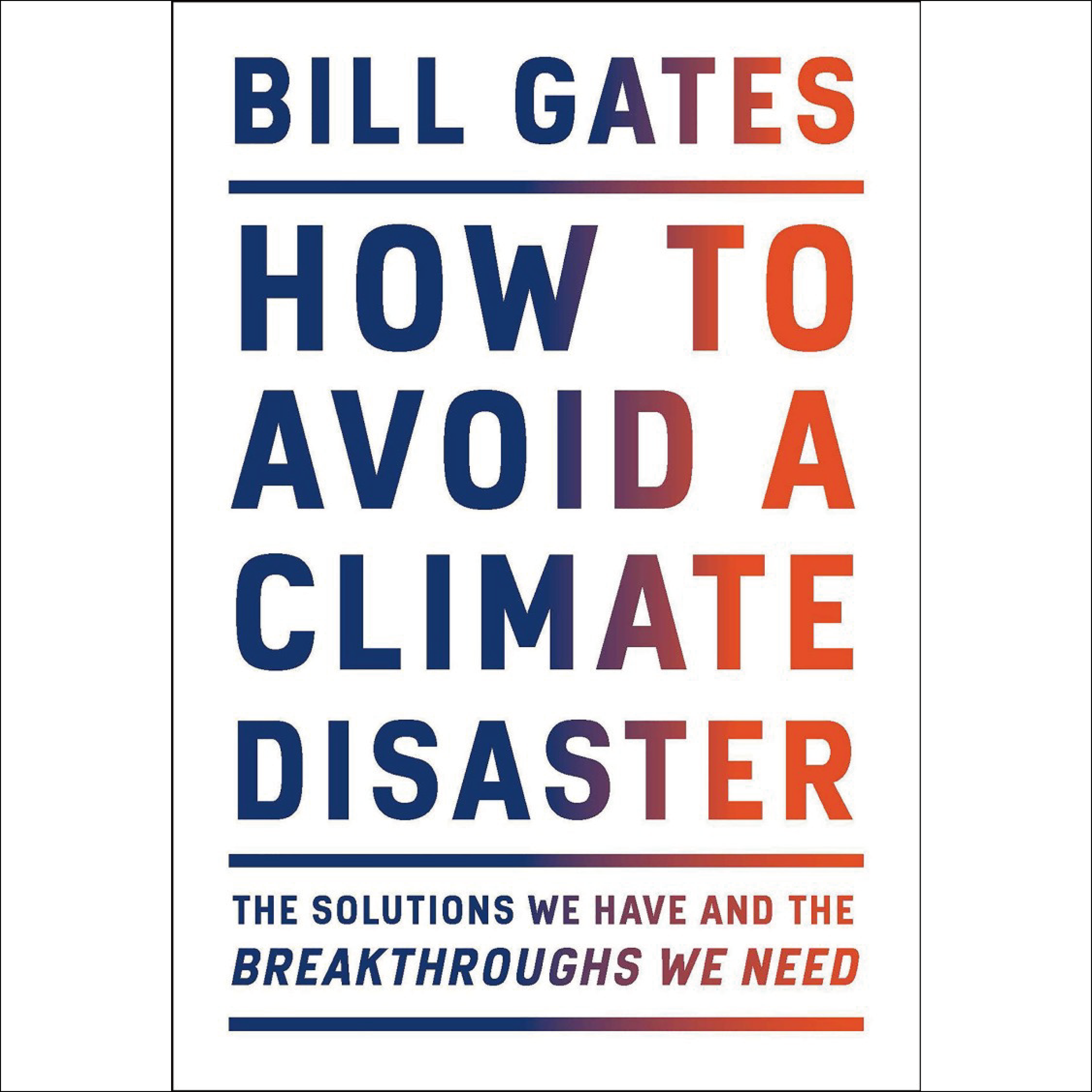|
[날씨가 주는 신호: 씨그널] 뜨거워진 지구, ‘가을태풍 전성시대’를 부추기다 올해 9월 이후 발발한 태풍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9월 8일 ‘링링’, 23일 ‘타파’, 10월 3일 ‘미탁’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7일 ‘하기비스’까지 합세했다. 3개 이상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것은 1951년 이래 초유의 사태다.
태풍은 본디 여름의 전유물이었다. 장마와 태풍을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했던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실제로 1904년부터 2011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태풍 330건 중에 6~8월까지 발생한 비율은 72.4%(239건)나 된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는 태풍은 필연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한다. 이맘때만 되면, 마치 연례행사처럼 맞는 이 재난을 걱정하고 대비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태풍이 출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도와 위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가 되면 비로소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과거의 공식은 이미 깨졌다. 그리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운 것처럼, 뒤늦게 찾아오는 태풍은 더욱 위협적이다. 
조금씩 더 많은,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태풍의 ‘필요충분조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감도는 9월. 우리나라에는 매년 이맘때를 전후해 반갑지 않은 불청객, 태풍이 찾아오곤 한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일본 근해를 지나 한반도로 북상하는데, 보통은 많은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분다.
우리는 태풍이 자주 찾아온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태풍의 형성 조건은 꽤 까다롭다.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격상돼 몸집을 유지하려면 바다의 수온이 27°c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뜨거운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 육지 날씨가 30°c를 우습게 넘기곤 하지만 수온이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여간 덥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육지와 바다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의 발생이 쉽지 않다.
그런데 왜 가을 태풍이 빈번해진 것일까? 해답은 지속되는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래 지구 온난화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880년 이래 130여 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85°c가 상승했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는 무려 평균기온이 1.5°c나 올랐다.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폭염일수는 2013년 18.5일, 2016년 22.4일, 2018년이 31.5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구온난화는 태풍의 어머니
높은 기온 자체도 문제지만, ‘더운 날’의 지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9월과 10월 기온은 매년 평년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전국 해수욕장들은 과거 8월 중하순이면 폐쇄했지만 2010년 이후로는 9월 말까지도 문을 열어 놓는다.
이처럼 수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열대성 저기압들이 앞 다퉈 태풍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전에는 역대급으로 강력한 태풍이 한해 하나 정도로 발생해 돌연변이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한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는 흡사 태풍들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강풍과 폭우, 늦깎이 태풍이 무서운 이유
90년대만 해도 태풍은 8월에 자주 발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8월이 가장 더웠고, 태풍의 입맛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풍의 발생시기가 늦춰지고, 태풍의 몸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대로 가장 강력한 태풍들은 모두 2000년대 들어 발생한 것이다. 2002년 9월 루사는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1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듬해 9월에 찾아온 매미는 131명의 인명 피해와 4조2천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역대 태풍들 중 순간 최대풍속 ‘TOP5’ 역시 2000년 이후에 발생했다. 2002년 매미가 60m/s, 2000년 프라피룬이 58.3m/s, 2002년 루사가 56.7m/s, 2016년 차바가 56.5m/s, 그리고 올해 링링이 54.4m/s다.
태풍 위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강수량 역시 비슷하다. 2002년 루사가 870.5mm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007년 나리 420.0mm, 2003년 매미 410.0mm 등이 물폭탄을 쏟아냈다.
10월 태풍의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1951년 이래 10월에 찾아온 태풍은 6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함께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서 10월 역시 태풍의 계절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더 북쪽까지 이동하고, 더 늦은 시기까지 세력을 유지하는 추세다. 
갈수록 크고 날카로워지는 태풍의 공격 (사진: 연합뉴스)
머지않은 겨울 태풍의 시대
기상청이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부산-목포 지역에 걸친 아열대 지역은 21세기 말쯤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과 황해도 연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시기 평양 기온은 현재 연평균 16.6°c인 서귀포 기온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또 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같은 편서풍대에 속해 있어 중국에서 한반도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로 인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고스란히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은 한겨울에도 태풍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22세기를 전후해 한반도에 4계절 내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서유럽에는 이미 지난해 겨울 태풍이 몰아쳤다. 상대적으로 태풍 안전지대였던 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등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연이어 찾아온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고위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카리브해 지역이나 대서양 중부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이 유럽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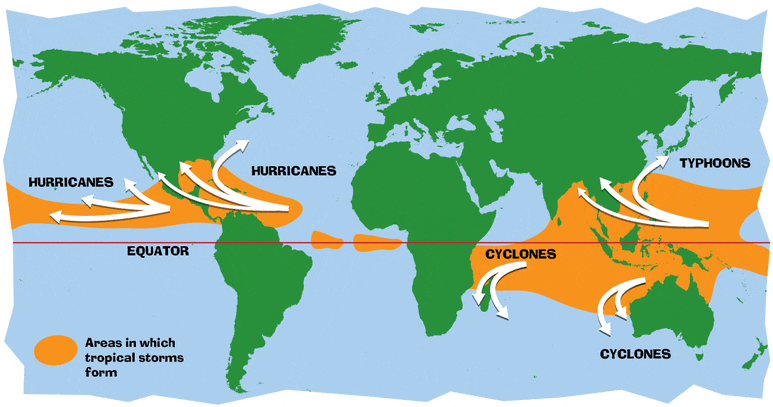
세계 태풍지도. 우리와 같은 위도의 대서양 연안도 이젠 안전하지 않다.(사진: www.northcarolina.edu)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그저 속도만 늦추는 게 고작이다. 아열대화가 시작된 한반도에서 태풍의 빈도와 위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도 결국 시간문제다. 태풍이 일상이 되는 시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